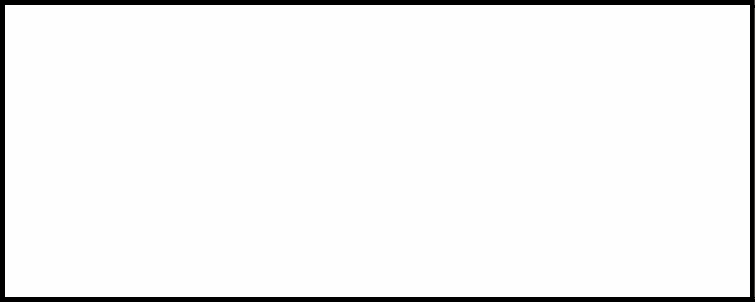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1월 27일 장중 5,000선을 돌파한 뒤 5,084.85로 거래를 마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80년 기준지수 100으로 출발한 이후 46년 만의 일이다. 증권가에서는 ‘오천피 시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그동안 상징처럼 여겨지던 3,000, 4,000선을 넘어 이제는 5,000이 현실이 된 셈이다.
코스피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 전체의 시가총액 변화를 종합해 계산하는 지표로, 한국 경제와 자본시장의 체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바로미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의 주가가 오르면 지수도 함께 움직이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곧바로 하락한다. 기업 실적 전망과 투자심리, 글로벌 자금 흐름이 동시에 반영되는 ‘시장 온도계’에 가깝다.
이번 상승을 이끈 축은 반도체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와 서버 투자 증가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졌다. 실제로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분 대부분을 견인했다. 여기에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외국인 투자자 재유입, 기관 매수세가 더해지며 상승 탄력이 붙었다. 증권업계에서는 “실적과 유동성이 동시에 작동한 상승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수가 오를 때 시장은 낙관으로 채워진다. 기업의 이익이 늘 것이라는 기대, 자금 유입 확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맞물리면서 주식 가격은 빠르게 오른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처럼 국내 자금이 주식 비중을 늘릴 경우 수익률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적립식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직장인 입장에서도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 코스피 상승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이유다.
그러나 반대의 장면도 분명 존재한다. 지수가 떨어질 때는 외국인 자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는다. 소비와 투자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최근처럼 신용거래융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는 조정이 시작될 경우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상승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주가는 미래 기대를 먼저 반영하는 선행 지표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돼도 기업 실적 전망이 밝으면 지수는 오를 수 있고, 반대로 경기 지표가 양호해도 불확실성이 커지면 하락한다. 최근 코스피 급등 국면에서도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숫자가 높다고 해서 곧바로 서민 경제가 좋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5,000이라는 숫자가 갖는 상징성은 작지 않다. 한국 증시가 과거 ‘저평가 시장’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글로벌 자금이 주목하는 시장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대형주 쏠림과 밸류에이션 부담, 실물경제와의 괴리라는 과제도 함께 드러냈다. 상승이 지속되려면 기업 실적이 실제로 뒷받침돼야 하고, 제도적 신뢰와 투명성도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