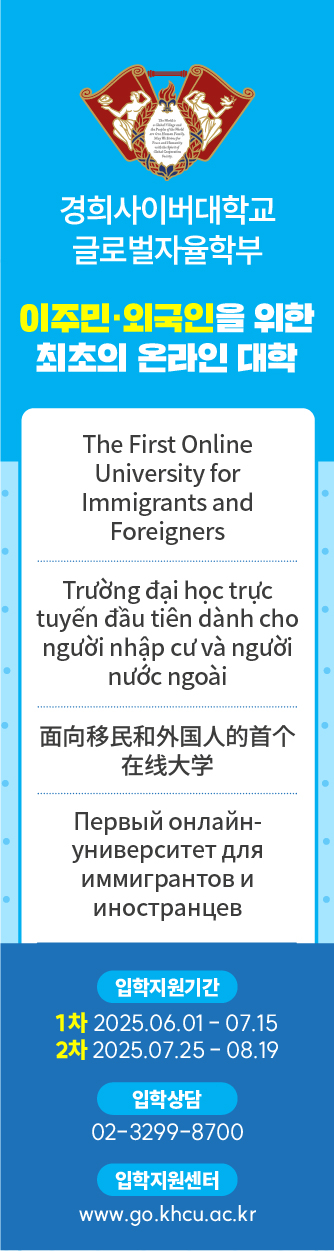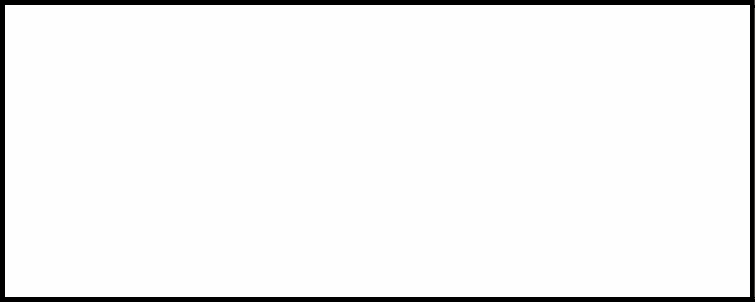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은 단순히 외국의 큰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은 단순히 외국의 큰 사건으로만 볼 수 없다.
일본, 대만, 중국 등 인접 국가에서 잇달아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한반도 역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곳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지진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일본 이시카와현에서는 규모 7.6의 지진이 새해 첫날을 뒤흔들며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불과 몇 주 뒤인 1월 23일에는 중국 신장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일어나 혹한 속 구조작업이 이어졌다.
2025년 4월에는 대만 화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고층 건물이 붕괴되고,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번 러시아 캄차카 지진은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례로, 동북아시아 전체가 현재 지진의 위협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한반도에서도 연평균 50회 이상의 지진이 관측되고 있으며, 2016년 경주 지진(규모 5.8), 2017년 포항 지진(규모 5.4) 이후에는 내륙지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크게 높아졌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지진은 해저 지진인 경우가 많아, 단순한 진동 피해를 넘어 쓰나미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진의 증가가 단순한 자연현상에 그치지 않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지각균형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한 번의 재난이 다른 재난을 불러오는 ‘복합재난’ 양상이 빈번하다고 지적한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비다. 제도적 보완은 정부의 몫이지만,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건물 안에 있다면 책상 밑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로 들어가 머리를 감싸야 하며, 엘리베이터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흔들림이 멈 춘 뒤에는 가까운 출입구나 비상구를 통해 천천히 밖으로 나가야 한다. 밖에 있을 경우에는 건물, 간판, 유리창, 가로등 등 낙하 위험물이 없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운전 중이라면 즉시 차량을 도로 한쪽에 정차 하고, 라디오나 스마트폰을 통해 재난 정보를 수신해야 한다. 해안 지역에서 지진을 느낀 경우에는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쓰나미는 지진 직후 수십 분 안에 해안가를 덮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핵심이다.
또 첫 번째 물결이 지나간 후에도 두 번째, 세 번째 쓰나미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보가 해제되기 전에는 절대 해안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학교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대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정에서도 정기적으로 ‘지진 대피 경로’ 와 ‘비상 물품’ 점검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가족이 떨어져 있을 때를 대비해 연락 방법과 만나는 장소를 미리 정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일상 속 준비를 조금 더 쉽게 도와주는 도구로는 재난 정보 앱 활용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디딤돌’ 앱은 내 주변 대피소 위치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지진이나 쓰나미 발생 시 실시간 경보를 제공한다. 기상청의 ‘날씨알리미’ 앱이나 포털 위기 알림 서비스도 유용하다. 미리 설치해두고 사용하는 습관만으로도 위험에 대처하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