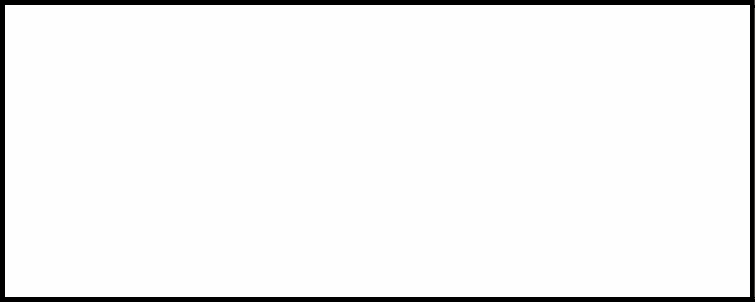韓国の新聞記事は、その公的記録としての性質と社会的機能を反映するため、一般的に文語体で書かれています。この文体は、文末を「〜した」「〜である」と終え、客観性と中立性を示す基本的な形式です。新聞は特定の人物に語りかけるのではなく、不特定多数へ情報を提供するため、明確で簡潔な表現が求められます。
一方、「〜しました」「〜見ました」のような口語体の丁寧語は、日常会話や親しみを込めた表現で使われるスタイルです。このような文体自体に問題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児童向け新聞や教育教材では、読者の理解度に合わせた親しみやすい表現として効果的に使用されています。
しかし、多文化新聞において成人読者を対象にした記事でもこの口語体が使われる場合、その適切性には疑問が生じます。多文化新聞の読者層には、結婚移民者や外国人労働者、多文化背景を持つ青年などが含まれ、主に成人です。韓国語の理解度は様々であるものの、読者すべてが「簡単な日本語しか理解できない」という前提に立った表現は、誤った固定観念を反映する恐れがあります。
表面的には「読みやすさ」を配慮した表現に見えるかもしれませんが、「多文化読者には正式な新聞文体が難しい」と仮定すること自体が、読者の能力を低く見積もる偏見につながりかねません。これは、親しみやすさを装いながらも、読者を矮小化する形になってしまう可能性があります。
さらに深刻なのは、新聞紙面に「中略」と編集上の記号がそのまま掲載される例です。「中略」は本来、他者の発言や文章を引用し、その一部を省略する際に使われます。しかし記事本文の中にこの表記が残っている場合、その記事が未完成であるか、編集が不十分であることを示しています。特に紙の新聞は文化体育観光部(日本の文科省に相当)に登録された正式な発行物であり、それ自体が完結した記録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詳細はウェブで」という形は、独立した公的記録としての新聞の責務を果たせていません。
メディア研究者たちは、多文化新聞の存在がメディアの多様性に貢献している点を評価する一方で、「親しみやすさ」や「分かりやすさ」を理由に基本的な報道の形式や文体を軽視してはならないと警告しています。特に公的資金を受ける媒体である場合、正確な編集、適切な文体、情報への責任は必須条件です。
新聞は単なる情報伝達手段ではありません。ある時代の社会を記録し、後世に残す文化的資料でもあります。文体や編集の選択は単なる技術的な問題ではなく、そのメディアが読者をどう捉えているか、どのような社会的役割を果たそうとしているかを反映する重要な要素です。多文化読者を対象にする場合、「簡単にする」ことよりも「正確かつ敬意を持って」伝える姿勢が求められます。
最終的に重要なのは、文体そのものではなく、それがコンテクストに合っているか、読者を成熟した主体として尊重しているかです。多文化読者も他の読者と同じように、完全性・明確性・信頼性のある報道を受ける権利があります。親しみやすい口調は有用であっても、編集の質を下げたり、基本的な報道形式を崩す理由にはなりません。
新聞が知識と理解の橋渡しを担うならば、読みやすく、かつ専門的に構築されたコンテンツを提供する必要があります。そのためには、言葉の選択に込められた前提を見直し、読者の多様性・能力・尊厳を尊重する姿勢が不可欠です。
(한국어 번역)
한국의 신문 기사 문체는 공적 기록물로서의 특성과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주로 문어체를 사용한다. 문어체란 문장의 끝맺음이 ‘~했다’, ‘~이다’ 등의 형태로 수미를 맞추는 방식이며, 이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적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형식은 독자가 특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언론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형태이기도 하다. 즉, 신문은 대화를 나누는 대상이 아닌 기록과 전달의 수단이기에, 품격 있는 문장 구조와 명확한 서술형 태도가 그 기본이다.
반면 “~했어요”, “~봤어요”와 같은 표현은 구어체 존댓말로 분류되며, 주로 상대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거나 일상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 이러한 문체는 어린이 대상의 학습지, 청소년 교육 콘텐츠 등에서는 기능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문 기사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어린이신문에서는 구어체 문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독자의 이해력에 적합한 완곡한 문체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문화신문과 같이 성인 독자층을 포괄하는 매체에서 이러한 구어체 문장을 기사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성 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문화 독자들은 결혼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성인이 많고, 한국어 이해도 또한 다양하다. 이들을 대상으로 구어체 문체만을 고집하는 것은 그들을 낮은 문해 능력을 지닌 존재로 단정하는 편견을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언어적 대상화’의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 친근한 표현은 독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리면 결국 ‘쉽게 만드느라 실수하는’ 일방적 소통으로 전락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신문 지면에 ‘중략’이라는 편집적 표시가 그대로 남는 사례다. 중략은 원래 다른 사람의 글이나 발언을 인용할 때 일부를 생략하는 표시로 사용되지만, 기사 본문에 편집의 흔적으로 남아 있다면 해당 기사 자체가 미완성 상태이거나, 지면에 실려서는 안 될 표식이 그대로 남은 편집 오류임을 드러낸다. 특히 지면신문은 단독으로 완결성을 가진 기록물이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발행물로서 법적·제도적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면에 실린 기사는 ‘독립적’으로 완성돼야 하고, 특정 내용을 생략하고 “더 보려면 우리 인터넷신문에 접속하라”는 방식은 기록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다문화신문이 그 존재 자체로 언론의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친근함이나 접근성을 이유로 일반적인 저널리즘 형식과 원칙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언론이라면 책임감 있는 편집과 정확한 문체 사용은 더욱 요구되며, 독자의 이해를 존중하는 방식과는 별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특정 시대와 사회를 기억하는 기록물이자 문화적 증거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문체와 편집 방식은 단순한 글쓰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매체가 독자를 어떻게 위치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이다. 다문화 독자를 위한 신문은 문장을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정확하고 존중하게’ 전달하려는 고민으로부터 시작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적 접근성과 저널리즘적 형식이 균형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체의 유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맥락에 맞게 사용되며, 독자의 이해와 존엄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가이다. 신문이 지식과 공감의 다리를 놓는 매체라면, 다문화 독자들에게도 ‘제대로 된 신문’이 필요하다. 누구를 위한 친근함인지, 누구를 위한 서술인지 다시 묻고, 평등하고 정교한 소통을 위한 문체를 고민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