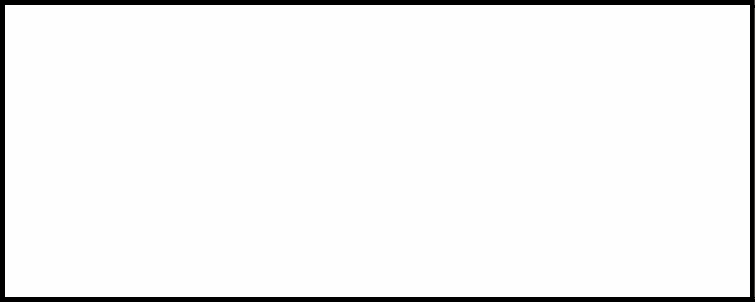영국이 불법 이주자 대응의 중심축을 ‘보호’에서 ‘송환’으로 옮기고 있다. 망명 제도 전반을 손보는 대신, 출신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귀환을 늘리는 방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영국이 불법 이주자 대응의 중심축을 ‘보호’에서 ‘송환’으로 옮기고 있다. 망명 제도 전반을 손보는 대신, 출신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귀환을 늘리는 방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 앙골라와 나미비아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를 구체화했다.
동시에 송환에 비협 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은 협조 부족을 이유로 비자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 내 난민 수용 현실과 맞닿아 있다. 난민 신청자 증가로 임시 숙소로 활용되는 호텔이 급증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관리되지 않은 이주 시스템의 한계”로 규정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정책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국은 그동안 인도적 보호와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질서 있는 이주 관리’에 더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불법 입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 전반에 깔려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권단체들은 송환 협정이 체결된 국가들의 인권 상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개별 난민의 사정이 행정 효율 논리에 밀려날 수 있다는 것 이다.
특히 송환이 외교 협상의 도구로 활용될 경우, 난민 보호 원칙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을 경계한다. 영국 사회 내부에서도 긴장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난민 숙소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이슈로 번지고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혐오와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다. 이민 문제가 단순한 행정 사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와 결속을 시험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