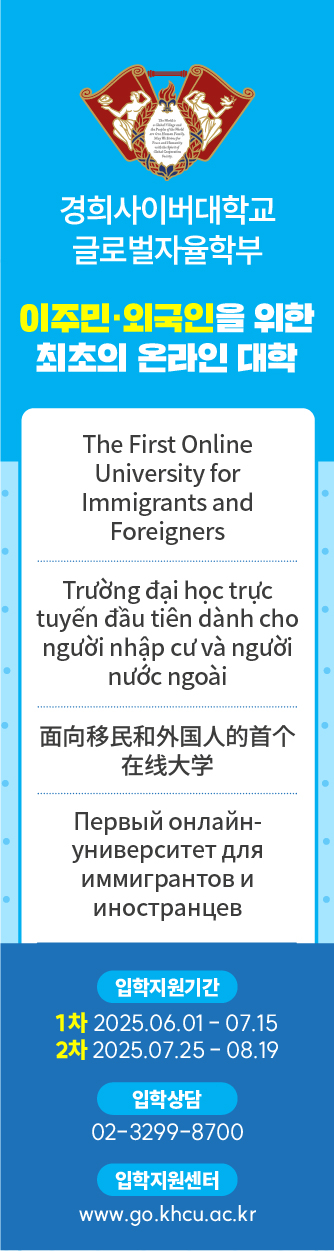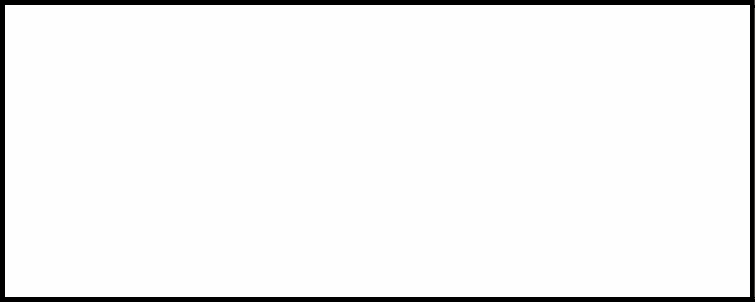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6월 현재,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수용 방식이 단기 체류보다 장기 정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체류 목적별로 보면,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분야는 유학 및 연수 목적 체류자다. 2024년 기준, D-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은 26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동안 위축됐던 유학 수요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준다. 유학생의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이 대표적이며, 수도권 주요 대학뿐 아니라 지방 국립대와 한국어 교육기관에도 골고루 분포돼 있다.
다음으로는 결혼이민자(F-6)가 18만 명을 상회한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자와 결혼한 배우자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해 있다. F-6 체류자는 ‘가족 단위 이주’의 대표적 사례이며, 동시에 사회통합 정책의 주요 대상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의 남용이나 허위 결혼 문제로 인해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은 약 2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은 체류 기간을 별도로 갱신할 필요가 없고, 직업 선택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일부 공공서비스 이용도 가능해, 실질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장기 정주 인구로 자리 잡은 셈이다. 영주권자에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 전문직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외국인 체류의 가장 큰 비중은 취업 목적 체류자, 즉 E 계열 비자 소지자들이 차지한다. 2024년 기준, E-1부터 E-10까지의 전체 취업자격 소지자 수는 약 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비전문취업(E-9) 대상자는 47만 명에 달하며,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에서 핵심 노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용허가제의 통제를 받으며, 고용처 변경이나 직종 전환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반면, 전문인력(E-1~E-7)은 약 9만 명 수준이다. 이들은 교수, 연구원, 기술자, 외국계 기업 종사자 등으로서 비교적 자유로운 체류와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비율로 보면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체류자 구성은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다. 생산 가능 인력과 가족 단위 체류자가 중심을 이루며, 이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을 노동력 확보와 결혼·출산 등 사회인구 유지의 틀 안에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체류 자격별로 허용되는 활동 범위나 사회적 권리가 크게 다른 점은 한국의 외국인 정책이 단일한 제도라기보다 계층화된 체류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는 직장을 변경하려면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된 업종 외의 활동은 불가능하다. 반면 F-5 영주권자는 직업 선택에 제한이 없으며 일부 정주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체류 자격은 단순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삶을 꾸릴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동하고 있다.
관련 기사
01. 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02. 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03. '일은 허락되지만, 삶은 어떤가' E 비자, 대한민국 취업비자의 경계_[비자 시리즈03]
04. 공부할 수 있지만, 남을 수는 없는 구조… 유학생·연수생·구직자의 체류 경계 [비자 시리즈04]